[인문교양특강]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
주제 ② 허약한 주체의 세상 읽기: 인문학과 글쓰기
“내가 ‘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나요?”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두 번째 주제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 소장은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Greedy dog)에서 강물에 비친 모습을 다른 존재로 인식한 개를 소개했다. 이야기 속 욕심 많은 개는 고기를 문 채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다리 아래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다. 강물에 비친 더 크고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뺏으려고 짖다가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강물 속으로 떨어뜨려버렸다.
“왜 짖었을까요? 자기란 걸 몰랐으니까요. 개들은 평소 거울 앞에 서면 자기라고 알지 못하잖아요.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거울을 보며) 쟤는 뭐지? 겁먹은 거죠. 동물은 주체가 아니에요. 자기임을 아는 게 ‘주체’예요.”
“강의실에 있는 여러분은 실제일까요?”

유아발달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임을 모르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아는 주체 형성 시기가 있다. 안 소장은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는 건 대단한 인식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각에 의존한 자기 동일성 확인은 빛과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물체가 내 망막에 들어와서 해석해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라며 “그건 기반이 약한 자기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거울에 입력한 내 모습이 머릿속에 있지만 세상이 무인도고 아무것도 비교할 생물이 없다면 내가 나라는 걸 알 수 없다. 주체란 결국 ‘타자’와 다른 차이를 통해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면서 세계 속에 자신을 변별해갈 수 있다. 안 소장은 “’A는 A이고, A는 B가 아니다’는 체계가 근대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의 주체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대개 ‘나’가 ‘나’라는 확신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강의실에 있는 게 꿈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내가 실제고, 가상 현실이 아니라고 확신하나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고민한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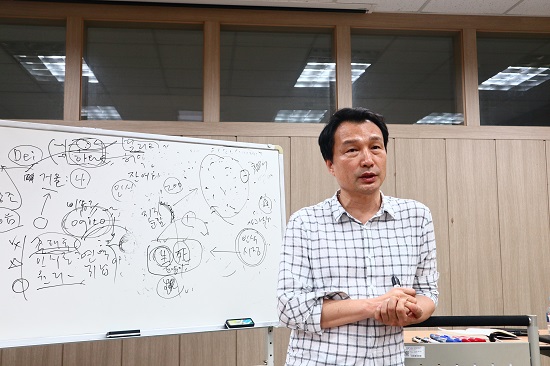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판정하고 확인할 때 판정하는 ‘자신’은 누구일까?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는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스미스는 인류가 축적한 경험을 통해 ‘공정한 관찰자’를 마음속에 상정할 수 있고,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안 소장은 구조주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가 쓴 ‘최종 심급(審級)’을 인용하며 “공정한 관찰자를 최종 심급으로 설정한 사람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대 철학이 생각보다 문제가 꼬였다”고 지적했다.
“인문학과 철학은 우리가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어 했는데 답은 명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허약한 주체는 근대적인 현상이니까요. 근대 이전에는 신(神)이 있었거든요.”
‘신은 죽었다’ 이후 달라진 나
근대 이전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체에 관한 고민이 없었다. 안 소장은 ‘물론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신은 죽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유물론자들 사이에서는 신이 ‘자기의식의 최종판’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근대 주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한 데카르트가 설명했다. 안 소장은 “’나는 생각한다’고 할 때 ‘나’는 어디서 왔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할 건지 시름을 앓다가 ‘나는 있다고 치자’고 살아왔다”며 “근대인들은 신이 몰락하면서 어디서 온지 모르는 나에 관해 불안해하거나 혹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나에 관한 허세 속에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데카르트 철학이 불완전한 가운데 <아큐정전>에 나오는 주인공 아큐처럼 ‘나는 생각하니까 나지’와 같은 연역적 존재론과 ‘나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만들어질 뿐’이라는 귀납적 존재론으로 나뉜다. 안 소장은 “데카르트는 연역적 존재론, 영국식은 경험론적 존재론”이라며 “둘 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적절히 섞은 윤리 체계를 만든 게 칸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삶의 불안과 인간 소외를 극복하면서 인간 주체성을 설명하고자 프랑스 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며 주창한 실존주의 철학이 나왔다. 또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미셸 푸코와 같이 ‘나는 외부에 구성된 존재’라고 설명하는 구조주의 사상이 나왔다. 안 소장은 “그러나 칸트 이후에 결론이 난 건 없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해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잠재적이고 임시적인 인간 주체
“허약한 주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읽는 세상이란 항상 임시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렇기를 바라는 희망일 때가 훨씬 많아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 쉽게 쓰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임시적이고 잠재적인 결론을 추구한다는 거죠.”
안 소장은 자기가 인식하는 자아가 절대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짚었다. 블랙박스 안에 고양이와 반감기를 가진 불안정한 핵 1개를 넣은 뒤 고양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사례로 들었다. 안 소장은 “고양이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50 대 50 확률이 맞을지 모르지만, 고양이의 생사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 인식”이라며 “진리든 사실이든 잠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자아에 관해 묻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보는 별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 알죠?”

별과 인간의 망막 사이 거리 차이로 별빛이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죽은 별이 되었을 수 있다. 안 소장은 “그렇다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별인가”라며 “’진짜 별을 봐야 진실인가’라는 문제는 사실 주체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에도 질문을 던졌다. 지구와 자전 방향이 반대인 금성에서 해를 보면 서쪽에서 뜬다. 안 소장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는 우리 상황에서 최선의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끊임없이 시스템을 회의하라
“지금까지 진리 앞에서 겸손하라고 주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분투, 모든 과정에서 존재론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정하면서 살면 자기 삶의 회의가 없어져요. 자기가 불안정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최선의 인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발판으로 자기를 사랑해야 해요.”
안 소장은 자신을 탐구하고 나아가 타인과 공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현대 사회 구조를 비판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이 자신과 타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공범 A와 B가 각각 심문을 받을 때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게 최선”이라며 “하지만 형량 1년, 2년, 10년 등 수치화한 선택지만 있고 신의를 지켰을 때 얻을 자존감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결국 서로 신의를 지키지 않는 선택이 합리적이다.

안 소장은 “딜레마 게임의 핵심은 정보 차단”이라며 “죄수들끼리 신뢰와 유대를 찾을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딜레마 게임은 혜택을 수치화해 현대 사회에서 상생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체계화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치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은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딜레마 게임을 보면 (우리는) 평생 갇혀 살아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선택’을 끊임없이 회의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존엄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존엄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전제는 있어요. 결국 답이 없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주체의 문제인 거죠.”
안 소장은 끝으로 “존재를 위한 생각이 글쓰기에 담겨 있으니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자아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며 “완성되진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 속에서 세계를 잘 성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묻고 궁금증을 가지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신을 확인하고 확정하면서 자기다운 자기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특강은 [인문교양특강I] [저널리즘특강] [인문교양특강II] [사회교양특강]으로 구성되고 매 학기 번갈아 가며 개설됩니다. 저널리즘스쿨이 인문사회학적 소양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그것이 언론인이 갖춰야 할 비판의식, 역사의식, 윤리의식의 토대가 되고,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2학기 [인문교양특강]은 원종원 안치용 이택광 김용락 권순긍 조문환 정희진 조효제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강연기사 쓰기 과제는 강연을 함께 듣는 지도교수의 데스크를 거쳐 <단비뉴스>에 연재됩니다. (편집자) |
편집 : 권영지 기자
단비뉴스 전략기획팀 윤종훈입니다.
정보를 캐내는 꾼이 되겠습니다.

